[노트북을 열며] 검찰에 확인하라던 '문재인 실장'

마감 시간은 다가오고 ‘왜 확인을 못하느냐’는 데스크의 재촉이 겹친다. 그때 누르는 전화번호가 ‘문재인 실장’이었다. 그의 첫 대답은 언제나 4가지 중 하나였다. ①맞다 ②틀리다 ③모른다 ④말해줄 수 없다. 그리고 부속 설명을 간단히 한 뒤 “참여정부의 정통성을 흠집내려는 이명박 정부 의도에 말려들면 안된다”는 말을 이어갔다. 그토록 원하는 답을 들었으니 뒤이은 ‘훈계’도 감사하게 들렸다. 억울함을 느끼는 상황에서도 국민 알권리를 우선하고 취재 활동을 존중하던 그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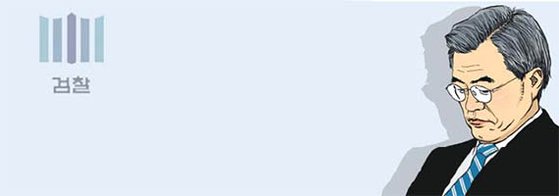
1일 훈령 시행 뒤 기자들은 수사를 하지 않는 검사(전문공보관)에게 수사 상황을 물어봐야 하는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 현재까지는 정부의 의도대로 취재 현장이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다. 검사를 취재해 역사를 바꿨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예로 들며 훈령을 비판해도 현 정부나 지지자들의 생각은 꿈쩍하지 않는다. “우리 문재인 정부는 나쁜 일을 저지를 리가 없다”는 생각이 굳기 때문이다. 일반인에겐 높은 벽으로 느껴지는 검사를 수시로 접촉하는 기자들의 ‘특권’도 차단했으니, 이 역시 지지자들에게 통쾌함을 주고 있다.
그럼에도 잘못된 통제가 정당화되진 않는다. 이미 검사가 누군가에게 수사기밀을 누설하면 처벌 받게 돼있고, 기자가 피의사실을 보도했다가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면 이 역시 처벌을 받는다. 그런데도 검사의 언론 접촉 금지까지 원칙으로 정하는 건 과잉 통제다. ‘문재인 실장’이 취재 활동을 적극 배려하는 척하며 복수의 시간을 기다려왔다고는 아직 믿고 싶지 않다.
최선욱 사회2팀 기자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