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의 서재] 근대 과학혁명, 합리성 아닌 투쟁 정신에서 나왔다
"종교·이념 등 배제한 '현실에 대한 설명력'
이 '과학의 철칙'이 지식의 대폭발 이끌어"

우리는 정말이지 특별한 시대에 살고 있다. 수천년 역사에서 범선, 수레, 말, 땔감, 주판에 의존하고 질병과 기아에 시달리던 삶을 벗어나 전기와 컴퓨터, 내연기관과 비행기를 이용하며 풍요와 장수를 맛보기 시작한 지 겨우 100년 안팎이다.
이런 대변혁을 촉발한 계기는 17세기 이후 유럽에서 본격화된 근대 과학혁명과 이후 전개된 지식의 대폭발이었다. 그런데 왜 찬란했던 그리스 로마 문명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근대 이전 유럽에 비해 월등히 우수한 과학기술을 자랑했던 중국과 이슬람 문명은 또 어떤가?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를 만들었다는 고려와 그를 계승한 조선은 왜 그런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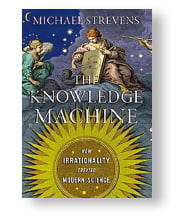
미국 뉴욕대 철학교수 마이클 스트레번스는 《지식 머신(The Knowledge Machine)》에서 근대 유럽에서 처음 등장한 ‘과학의 철칙’을 중요한 원인으로 꼽았다. 그리스 철학자도, 중세 기독교 사제와 아랍·인도의 학자들도, 고려와 조선의 학자들도 다 나름대로 과학과 발명을 일궜지만 그들에게는 불행하게도 이것이 없었다. 이 철칙의 가장 큰 특징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과학자가 오직 ‘현실에 대한 설명력’만을 과학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거기에 종교, 이념, 또는 정치적 이해가 터럭만큼도 개입하지 않게 됐다.
고대 그리스 학자들도 물리현상을 관찰하고 실험했지만 대부분 결론을 철학적 근거와 결부시켰다. 중세 유럽 학자들은 신의 섭리와 아름다움을 합리화하는 데 모든 연구의 목적이 있었다. 조선 학자들은 주로 음양오행설이나 성리학 같은 세계관 속에서 자연과 물리현상을 풀이했다. 이런 세계관들에 위배되는 모든 연구는 대부분 이단으로 몰렸고 사회적 단죄 대상이 됐다.
17세기 초 프랜시스 베이컨과 르네 데카르트는 진정한 지식은 모든 우상과 선입견을 다 부정하고 오직 현실 데이터만으로 세계를 설명하는 데서 나와야 한다고 했다. 이후 근대 과학은 이 정신에 입각해 비상(飛翔)하기 시작했다. 뉴턴, 다윈, 아인슈타인이 유럽에서 등장하고 조선, 중국, 이슬람 세계에선 나올 수 없었던 이유다. 물론 이들조차 개인적으로는 전통적 종교와 이념의 굴레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했다. 그러나 그것은 내면의 일이었을 뿐, 적어도 과학자의 자격으로 세상에 임할 때는 오직 설명력 하나만을 무기로 삼았다.
지금도 과학자 개인의 연구 동기는 자주 비합리적 선입견에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이런 개인의 비합리성조차 근대 과학의 철칙을 통과하면서 과학 공동체의 지식수준을 보다 개선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점이 특징이다. 개인의 이익 추구가 경쟁을 통해 사회의 편익을 향상시킨다는 ‘보이지 않는 손’의 원리는 경제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었다.
과학의 가치는 어떤 이론의 객관적인 옳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철칙에 의거한 과학자 사이의 투쟁정신 자체에 있다는 게 저자의 관점이다. 그런데 근대 과학혁명을 특징짓는 이 투쟁의 면모가 종교나 이념에서 나타난 투쟁과 너무 다르다. 오직 데이터 입증으로만 상대를 제압했을 뿐 서로 목숨을 겨누지는 않는다. 그들은 실험을 조작하면서까지 싸운다. 하지만 싸우는 과정에서 결국 누군가의 오류는 드러나게 돼 있다. 권위나 명성 따위는 통하지 않는다. 새로운 지식의 차원에 도달한 당사자들은 전열을 정비하고 다시 싸운다. 이런 싸움은 영원히 반복된다. 지금도 결론은 끝없이 달라지고 진화한다. 이것이 과학의 숙명이다.
코로나 사태로 온 세계가 불안에 떨고 있다. 과학자들이라고 해서 어떤 속 시원한 하나의 대답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과학의 속성상 불가피한 일이다. 하지만 정치인들은 자신의 이해에 따라 과학에 대한 적절한 무시와 선택적 오용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과학을 조롱하고 있다. 조율자로서 정치인은 자신의 입맛대로 이론을 통일시키려 해서는 안 된다. 정치인이 할 일은 모든 상충하는 주장들을 전면에 노출시키고 사회가 그것을 인지하도록 하는 일이다. 정책 판단과 합의는 그다음의 일이다. 이것이 진정한 과학 존중이다. 이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프로파간다와 비과학 정신이 세상을 지배하도록 놓아둔다면, 우리는 근대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셈이 된다.
송경모 <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 한경 고품격 뉴스레터, 원클릭으로 구독하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실리콘웍스 '역대급 성과급' 쏜다
- "지금이 분산 투자 기회"…주목받는 車반도체 '투톱' 어디?
- 비싸도 너무 비싼 '똘똘한 한 채'…3년 새 거래 30배 늘었다
- '곱버스' 올라탄 개미의 눈물…두 달 새 47% 손해봤다
- [단독] "장애학생에 '잔반급식' 의혹 인사가 정의당 새 대표라니"
- BJ감동란 '스폰녀' 비하한 윤서인…장문의 사과+해명 글 게재
- '의사 남편♥'서현진 아파트, 어디길래…37년 됐는데 30억?
- 신아영, 축구협회 이사 됐다
- "너무 힘들다"…'그알' 발언으로 방송 잘린 김새롬 근황 [종합]
- '루카' 이다희, 新 액션 여전사가 온다 [종합]